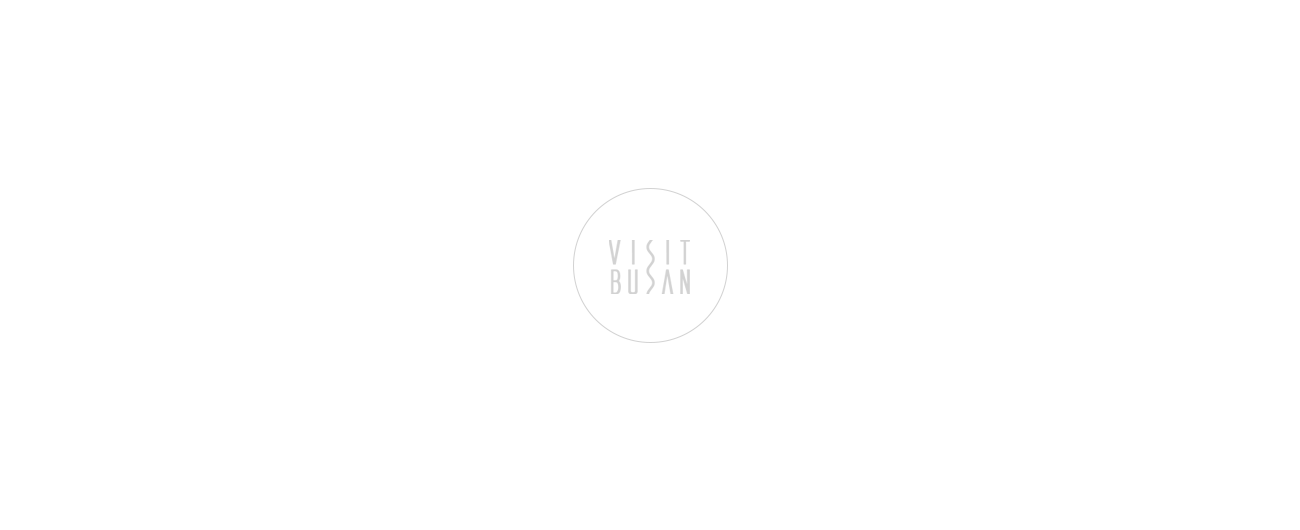
눈물로 약속한 공간 영도대교
꼭 다시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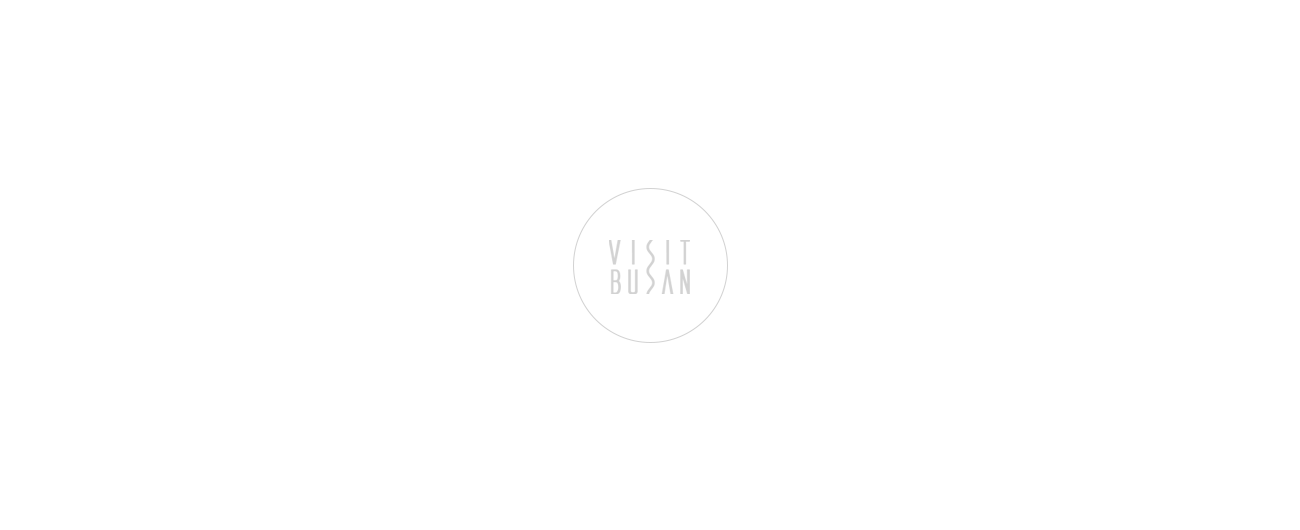
- 평점
 5.0
5.0 - 조회 35,224
영도다리 난간에 수없이 펄럭이던 저마다의 사연은 사라진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눈가가 젖어오는 사람들.
전쟁통에 가족과 생이별할 때 무조건 살아남아 영도다리에서 꼭 만나자고 눈물로 약속했던 공간.
영도대교라고 쓰고 영도다리라고 읽는다.
전쟁통에 가족과 생이별할 때 무조건 살아남아 영도다리에서 꼭 만나자고 눈물로 약속했던 공간.
영도대교라고 쓰고 영도다리라고 읽는다.
영도대교는 중구와 영도구를 연결하는 다리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다. 일제는 물자수탈의 기지 역할을 했던 부산항과 그 앞에 있던 섬 영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다. 1934년, 부산 최초의 연륙교이자 도개교가 개통되던 날 영도대교 앞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구경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한다. 다리 상판 한쪽을 들어 올려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영도대교는 영도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세 살 애기들도 다 아는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다.
한국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자 모여든 곳 또한 영도대교다. 피난민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던 부산의 명물 영도다리는 이별 후 재회를 위한 약속의 장소가 되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누런 종이 위에, 찢어진 천 위에 새겨져 영도다리 난간을 빼곡히 채웠다. 누군가에게는 재회의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피맺힌 원망을 안겨주었을 영도대교. 살았는지 죽었는지 속 시원히 듣고 싶어 찾아간 점쟁이들이 그나마 피난민들에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사라져버린 영도다리 아래 점바치골목에는 그렇게 피난민들의 희망과 절망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전쟁의 아픔이 세월에 묻혀가던 1966년 영도대교는 도개를 중단했다. 노후된 다리는 더 이상 늘어나는 교통량을 견뎌낼 수 없었고, 바로 옆에 부산대교가 개통하면서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영도다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시민의 노력으로 47년 만에 복원되었고 도개 역시 재개되었다.
피난민이 가족을 찾기 위해 몰려든 이 곳이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면 신호가 울리고 차단막이 내려간다. 통행하던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 서고 조금씩 천천히 영도다리가 올라간다. 15분 동안 진행되는 도개행사는 피난민의 아픔을 품었던 과거의 영도다리를 꼭 기억해 달라는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진다.
피난민이 가족을 찾기 위해 몰려든 이 곳이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면 신호가 울리고 차단막이 내려간다. 통행하던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 서고 조금씩 천천히 영도다리가 올라간다. 15분 동안 진행되는 도개행사는 피난민의 아픔을 품었던 과거의 영도다리를 꼭 기억해 달라는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진다.
언제 열렸냐는 듯 다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통행은 재개된다. 거닐어 본 영도대교의 난간이 유독 눈에 밟힌다. 매일 다리 위를 서성거리며 보고팠던 얼굴을 애타게 찾던 사람은 간 곳 없고 무심한 바다 위로 파도만 일렁인다.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픔을 간직한 영도다리를 건너 태종대로, 흰여울마을로 여행자의 발걸음은 계속된다.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픔을 간직한 영도다리를 건너 태종대로, 흰여울마을로 여행자의 발걸음은 계속된다.
이용안내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6전화번호
부산시설공단 1670-8114이용요금
무료교통정보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6, 8번출구 도보 4분
버스 6, 7, 8, 9, 17, 30, 71, 82, 85, 88, 113, 186, 190, 508 영도대교 하차
 경사로
경사로
여행꿀팁
영도대교 도개행사는 매주 토요일 14:00부터 15분간 진행된다.
연관태그
추천여행지












